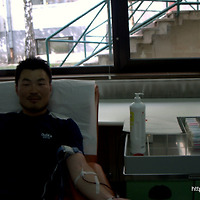어느새 2주가 지났다. 비도 잠잠해 진 것 같고 날씨도 좋다. 마지막으로 사라예보를 한 바퀴 돌고 출발한다.
BiH는 여러 모로 열악한 나라이지만, 생활체육 분야만큼은 우리보다 나은 듯 하다.

시내 여기저기에 있는 체육시설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생활체육을 즐기고 있었다. 사실 BiH의 전신이었던 구 유고슬라비아(Yugoslavia)는 스포츠 강국이었다고 한다.

이날 사라예보 시내에서는 풋살 대회가 펼쳐지고 있었다.
어린이들 경기지만 수준도 높고, 열기도 뜨거워서 한참을 지켜보았다. 풋살 자체보다 더 흥미로운건 바로 경기장이다.

광장에 인조잔디 매트를 깔아 간이 경기장을 만들었다. 임시 시설이지만 관중석도 그럴듯 했다. 혹시 BiH도 예전 우리나라처럼, 세계에 도전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며 대리만족을 느끼는 건가? 뭐, 그렇게 거창할 것까지는 없다. 유럽 대부분은 축구에 열광하니까!

풋살 경기를 마지막으로 사라예보를 떠난다. 뜻하지 않게 오래 머물렀지만, 그만큼 많은 기억과 생각할 기회를 준 곳이다.

시내에서 주위를 둘러봤을때 처럼, 가는 길은 역시 산길이다.
비소코(Visoko)의 피라미드 때문인가, 마치 잔디를 깐 듯 보이는 산의 모습은 어딘가 피라미드를 연상시킨다.

산 하나를 넘어 사라예보를 벗어났다. 작은 마을 입구, 이 근처에서 잠시 쉬어갈까? 이때 갑자기 멀리서 누군가가 손을 흔들면서 달려온다. 늑대처럼 보이는 제법 큰 개도 몇마리 따르고 있었다.
'저 녀석은 뭐지?'
그런데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고, 간곡히 서라고 외치길래 일단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뭐라뭐라 알아등지 못할 말을 쏟아낸다.
영어는 한 마디도 통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통에 지장은 없었다. 손을 잡아끌더니 바로 아래 시냇물로 데려간다. 시원한 시냇물에 세수를 하고 돌아오니 음료를 한 캔 건넨다.
목을 축이니 이번에는 자기 조끼와 허리띠를 풀어준다. 필요 없다고 해도 막무가내다.
조끼를 착용하니 환하게 웃으며 좋아한다. 짐도 많고 더운 날씨에 나에게 필요한 물건은 아니다.

궁리끝에 카메라를 꺼내 들었다.
"네 선물은 정말 고맙지만, 보다시피 나는 짐도 많고 날씨가 더워서 조끼는 필요없어. 대신 사진을 찍어주면 너를 기억할게."
사진을 찍고서야 조끼를 반납할 수 있었다. 그는 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 앉으라고 바닥에 깔아준다.
그의 사진도 남기고 싶다고 했더니 바닥에 벌렁 드러누워 포즈를 취한다. 휘파람을 한 번 불자 개들도 몰려들어 동참했다.

이번에는 주머니를 뒤적거린다. 펜, 동전 기타 잡동사니가 나온다. 그는 뭐 하나라도 주지 못해 안달인 듯 했다. 모두 사양하고, 갈 길이 멀어 출발하겠다고 하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한다. 대답도 듣지 않고 근처 수퍼로 달려가더니 사탕을 한 웅큼 들고 돌아왔다.
결국 사탕을 챙겨넣고, 한 알을 입에 물고서야 출발할 수 있었다.
말이 통하지 않아 이름도 알 수 없었다. 뭐 하는 친구인지도 모르겠다. 맨발로 개를 이끌고 다니고, 날씨에 안맞게 내복까지 착용하고 있는 모습. 어쩌면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따뜻했다. 이유가 뭘까? 단지 호기심? 아니면 꼭 대접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마음만 고맙게 새기며 다시 길을 나섰다.
길은 잘 닦여 있었다. 오히려 사라예보 시가지 보다 나은 편이었다. 굳이 표현하자면 오르막이지만 경사도가 거의 없어서 힘들지 않다. 날씨도 좋고, 오랜만에 Wing 안장에 앉아서인지 계속 이대로 달리고 싶은 기분이다.

전쟁 때문에 이미지가 엉망이 되어버린 나라. 하지만 주위 풍경을 보면 전쟁은 전혀 떠올릴 수 없었다. 잘 가꾸면 휴양지로도 손색이 없어 보인다.

발칸반도에서 늘 보던 짓다 만 빈 집도 보인다. 주변 주택은 대부분 기와를 얹은 삼각 지붕의 집이다. 집을 그려보라고 하면 누구나 그릴 법한 형태. 또 푸르른 산.
계속 이름모를 작은 마을을 지나친다. 마을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주변 이미지는 잊을 수 없는 곳이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 농촌인데 넓은 들은 거의 없다. 대부분 산지인 국가이니 어쩔 수 없겠지.


또 하나 특이한건, 땅 전체를 개간하지 않고, 집 근처 일부만 가꿔놓은 것이다.

씨 뿌린지 얼마 안되어서인지 밭에 흙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왜 땅이 저렇게 넓은데 밭은 작을까?

그러고 보니 이런 형태는 Gacko에서부터 계속 보였다. 처음에는 지뢰 때문에 활동 범위가 제한되는 게 아닐까 싶었는데, 가만보니 그건 아닌것 같다.

그럼 단지 게으르거나 필요 이상의 수확에 대한 욕심이 없어서? 그것도 뭔가 불충분한 설명이다. 주위 풀밭이 목초지라기에는 소나 양이 보이지도 않는다.

뭔가 알 수 없는 동네다. 말이라도 잘 통하면 누군가 잡고 물어보겠는데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거의 없다.
BiH는 계속 이랬다. 땅은 넓은데 대부분 산지이고, 인구 밀도는 매우 낮고, 가끔 나오는 마을도 규모가 작다. 아, 어쩌면 인력 부족으로 아직 손을 못댄건 아닐까?

어느 새 평지는 끝나고 다시 가파라진다.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이미 알고 있었다. 해발 1,000m에 가까운 고지를 한 번 넘어야 한다.

한발 한발. 영차영차 나가는데 다행히 가파른 오르막길은 길지 않았다. 정상에 올라서자 Good Bye 표지판이 맞아 준다. 이제 사라예보 주(Kanton)가 끝난 것이다.
앞에는 작은 터널이 있었고, 터널을 지나면 Konjic 주. 그리고 한동안 내리막이다.

정상에서 사라예보 주와의 마지막 순간을 즐긴다. 잠시 쉬며 숨도 고르고 물도 마시고…….

드디어 꼬불꼬불 긴 내리막이 이어진다. 거의 15km을 페달 밟지 않고 달린다. 와. 시원하다 못해 추울 정도다. 조끼를 받아 올 걸 그랬나?
내리막이 끝나고 보니 어느 새 Konjic 주, Konjic 시내에 도착해 있었다.
그런데 날씨가 예사롭지 않다. 잠시 후 머리위에 뭔가 떨어진다. 으으. 또 비구나. 사라예보 주에서는 그토록 좋았던 날씨가 산 하나 넘으니 금세 바뀐다.

그렇게 내리고도 아직 비가 남았나? 일단 비를 피해야 할텐데.
주위를 둘러보니 우산없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일단 아무 가게나 처마밑으로 가자. 마침 다리 근처에 짓다 만 건물이 하나 보인다.
와. 저기다! 다행이다. 어쩌면 오늘 잠자리까지 해결할 수 있겠구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BIH)'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35. 모스타르의 특산품은 볼펜? (13) | 2014.11.22 |
|---|---|
| 134. 동행. 모스타르를 향해 (10) | 2014.10.18 |
| 132. 비소코의 피라미드 소동 (4) | 2014.10.03 |
| 131. 사라예보의 장미 (6) | 2014.09.25 |
| 130. 사라예보의 총성 (6) | 2014.09.21 |